





추어탕 이야기 1편
: 사라지고 있는 음식, 추어탕의 역사
“일본에도 추어탕이 있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추어탕, 미꾸라지 이야기를 시작한다.
대답은 이렇다.
“100% 우리 방식의 추어탕은 없다.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있었던 음식이지만, 이젠 거의 사라졌다. 추어(鰍魚), 미꾸라지 요리는 미꾸라지찜, 미꾸라지 전골 형태로 남았다. 전문 음식점도 몇 개 정도 남았다. 일본인들도 미꾸라지를 먹었지만 이젠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출신 조리사 요나구니 스스무 씨(1949년∼ )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먹었던 ‘미꾸라지 음식’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
| “(전략) 일본 에도시대(1600∼1867년)에 미꾸라지는 국수와 더불어 서민의 패스트푸드나 다름없었다. 어디에서나 흔히 준비된 상태로 먹을 수 있어 빨리 먹고 일터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중략) 이맘때가 되면 논두렁 사이로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미꾸라지를 잡았다. 맨발로 논에 들어가 대나무 뜰채를 깊이 대고 그 위에서 물살을 휘젓거나 물가의 잡초를 밟아 미꾸라지가 걸려들도록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썼다.“ |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미꾸라지 음식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모두 미꾸라지를 먹었다.
미꾸라지의 한자 이름도 ‘니추(泥鰍 혹은 泥鰌)’로 같다. 우리는 한글 발음으로 미꾸라지라 불렀다.
요나구니 스스무 씨의 말대로 일본도 오래전에는 미꾸라지를 귀하게 여기고 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먼바다로 나갈 동력선이 발달하면서 그물도 정교해졌고, 바다 생선들이 흔해졌다.
사실 바다 생선에 비하면 미꾸라지는 별맛이 없었고,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해 논에서 미꾸라지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꾸라지 음식과 추어탕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일본도 그러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미꾸라지 식용 역사 🐍
우리의 미꾸라지 식용 역사는 길다.
900년 전인 1123년에 발간된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 1091~1153년)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이미 고려인들이 미꾸라지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王公)이나 귀인(貴人)이 아니면 먹지 못했으며, 가난한 백성은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즐겨 먹는 해산물에는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조개, 왕새우, 무명조개, 대게, 굴, 거북손 등이 있다. 해조(海藻)인 다시마도 식욕을 돋워주어 귀천없이 좋아하는 해산물이었지만, 냄새가 비리고 맛이 짜서 오래 먹으면 싫증 나는 음식이었다.
19세기부터 서서히 나타난 미꾸라지 식용기록
미꾸러지를 제외한 나머지 해산물은 모두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미꾸라지만 민물고기이다. 바다가 먼 내륙의 사람들은 모두 미꾸라지를 먹었을 것이기에 미꾸라지 식용의 역사는 길다고 볼 수 있다.
미꾸라지 식용 기록은 19세기 전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미꾸라지 음식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먹었지만 제사상이나 손님맞이 상에 올리지 않았으니 기록이 없을 뿐이다.
미꾸라지 음식, 추어탕 등은 19세기부터 서서히 나타난다. 실학자들의 기록이다. 이들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풍석 서유구(1764~1845년)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오주 이규경(1788~1856년)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미꾸라지 음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다.
추어탕의 뿌리, 밋구리죽과 추두부탕
실학자인 풍석 서유구는 “난호어목지”는 1820년 무렵 발간하였다. “난호어목지”에 나오는 추어탕은 ‘밋구리 죽’이다.
한반도 남부 농경 지역, 농촌의 서민들이 먹는 농촌형 미꾸라지탕, 추어탕을 기록으로 남겼다. 📖
| “(밋구리, 미꾸라지는) 기름이 많고 살찌고 맛이 있으며 시골 사람은 이를 잡아 맑은 물에 넣어두고 진흙을 다 토하기를 기다려 죽을 끓이는데 별미” |
다 같이 모여 만들어 먹었던 밋구리죽👪
눈에 띄는 부분이 미꾸라지탕, 추어탕이 아니라 ‘밋구리 죽’, 즉 ‘미꾸라지 죽’이라는 점이다. 탕이 아니라 죽이다.
곡물이 매우 귀했던 그 시기에는 미꾸라지가 들어간 죽을 끓여 먹었다. 적은 양의 곡물과 산나물, 들나물 시래기를 넣고 죽을 끓였을 것이다. 싱싱한 나물이 아니라 나물 말린 시래기였을 가능성도 있다.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만드는 이’와 ‘먹는 이’가 같았다. 주로 시골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잡아 진흙을 토하게 한 다음, 죽을 끓여 먹었다. 주막 등에서 사고파는 음식이 아니었다.
다른 곳의, 다른 미꾸라지 음식을 기록📖
풍석 서유구와 오주 이규경은 비슷한 시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중반을 살았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10~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오주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도 19세기 초중반 정도에 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꾸라지 먹는 방법을 보면 두 사람은 다른 곳의, 다른 미꾸라지 음식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이 전혀 다르다.
풍석은 '시골식'으로 미꾸라지음식을 먹었고, 오주는 '서울식'으로 먹었다.
| ✔ 풍석 서유구가 기록한 ‘밋구리죽’ : 시골, 농촌의 미꾸라지탕, 추어탕으로 다 같이 만들어 먹었다. 이름도 한글로 ‘밋구리’라 했다. ✔ 오주 이규경이 기록한 ‘추두부탕’ : 이름부터 ‘죽’이 아니라 귀한 두부까지 넣은 ‘탕’이다. 주로 한양의 반인(泮人, 관의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 |
추두부탕, 어떻게 만들었을까? 🍴
1. 진흙, 모래가 있는 계곡물에서 미꾸라지를 잡는다.
2. 잡은 미꾸라지를 물을 담은 옹기에 넣어 오륙일 동안 진흙을 토해내게 한다. 진흙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매일 세 번 물을 갈아준다.
3. 솥을 걸고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다. 물을 붓고 미꾸라지 50~60마리를 넣는다.
4. 솥에 불을 때면, 물이 점점 뜨거워진다. 미꾸라지들이 뜨거운 기운을 피해, 두부 속으로 들어간다.
5. 계속 불을 때면, 물이 끓고 미꾸라지들이 익는다. 꺼내서 두부를 자르면 두부 군데군데 미꾸라지들이 박혀 있다.
6. 기름을 두르고 전으로 부친다. 교맥분(메밀가루)과 달걀 부친 것 등과 섞어서 탕을 끓인다. 🍲
추두부탕, 밋구리죽과 다른 점
추두부탕은 ‘밋구리죽’과 전혀 다르다.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흙을 빼내는 방식부터 훨씬 세밀하다. 5~6일 동안 하루에 물을 세 번씩 갈아주면서 진흙을 빼낸다.
놀라운 것은 기름을 두르고 부친 전이다. 기름은 귀한 식재료였고, 이에 더하여 전을 부치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다. 번철까지 동원하여 전을 부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 🧐 '번철'이란? : 전을 부치거나 고기 등을 볶을 때 쓰는, 솥뚜껑처럼 생긴 조리도구 |
달걀도 오늘날처럼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달걀 부친 것’ 즉, 전을 만들어 요리하였다.
이처럼 미꾸라지탕을 먹기 위해 귀한 재료를 사용하며, 상당히 번거롭게 만들었다. 흔한 죽이 아니라 귀한 탕이다.
이 추두부탕을 ‘한양의 반인(泮人)’들이 먹는다고 했다. 화려한 추두부탕을 먹는 이 ‘반인’들은 대체 누구일까?
··· 다음시간에 계속
음식인문학 전문가
황광해 의 다른 글 보러가기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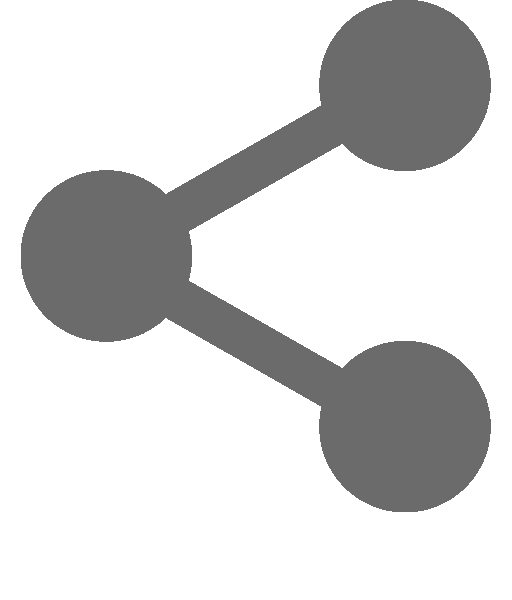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