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뭣이 중헌디?!
#10 새우젓 🦐
시간이 쌓여야
맛이 드는 것들이 있다 ⌛
고추장, 된장, 간장이 그렇다. 김치도 묵은지는 쌓인 시간만큼 맛이 깊어진다.
젓갈은 어떤가?
된장, 간장처럼 묵어야 맛이 든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 오징어젓갈은 길어야 보름 숙성이다. 양념 젓갈은 보통 그 정도다.
하지만 새우젓이나 액젓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새우젓은 토굴에서 숙성한다고 어렴풋이 안다.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은 역한 냄새 나는 식재료로 알고 있다.
젓갈 또한 장이나 김치처럼 시간이 쌓여야 제맛이 난다.
새우젓은 적어도 1년 6개월, 액젓은 3년을 기다려야 한다.

콩을 삶고 메주 만든다 🥔
여기에 물과 소금을 넣고 두면 발효가 일어난다.
생선에 소금 넣고 밀봉하면 발효가 일어난다.
콩과 생선은 발효에 있어서 단백질 제공원. 단백질은 미생물이 만든 효소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잘린다.
미생물 대사에 의해 아미노산 구성이 달라지지만 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감칠맛의 대명사 글루탐산이라는 것은 같다.
여기서 소금은 잡균의 발생을 막아 주는 역할.
소금은 삼투압으로 세포벽을 파괴해 콩이나 생선이 잘 분해되도록 해준다.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소금의 역할은 딱 두 가지뿐이다.
새우젓 만들기는 간단하다
새우에 소금을 약 30% 정도 넣으면 끝이다.
이도 배에서 잡자마자 하므로 판매자는 보관만 잘하면 된다.
동백하젓은 겨울에 잡기에 소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다.
새우젓 앞뒤로 토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는 냉동고 없던 시절, 그나마 선선한 곳이 토굴이었다. 바깥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도 토굴은 20도 안팎이니 새우젓 보관하기 적당했다.
토굴에 보관할 때는 지금보다 염도가 훨씬 높았다. 그래야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염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좋은 냉장 시설이 있으니 소금을 많이 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온도가 내려가도 🤧
시간은 여전히 젓갈에는 필요하다
젓갈은 시간이 쌓여야 맛이 든다.
소금이 삼투압으로 세포에 틈을 내면 미생물은 분해를 시작한다.
단백질은 시간에 따라 아미노산으로 변한다. 분해 과정에서 물이 생긴다. 그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글루탐산을 비롯한 맛 성분이 가득하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김장철에 새우젓 사러 가서 새우보다는 젓국에 더 목숨을 거셨다. 조금이라도 젓국을 더 담으려고 판매자와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단백질 분해할 때 나오는 물은 적다. 그러니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나 양에 관해서는 양보가 안 되니 여기저기서 실랑이다.
신기한 것은 귀한 새우젓국이 이상하리만큼 순댓국, 족발집에만 가면 차고 넘친다.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 해답은 간단하다.
물을 넣어 양을 불린다. 예전에는 중국산 새우젓으로 했지만, 요새는 더 멀리 베트남에서 새우젓이 들어온다.
새우젓에 물을 넣고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과 MSG를 넣는다. 한 통이 세 통, 네 통으로 금세 불어난다.
순댓국집에 가면 제일 먼저 새우젓부터 본다. 물이 흥건한 새우젓이면 넣지 않는다.
조미료는 이미 순댓국이나 순대에 충분히 들어 있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게다가 수입한 새우젓은 숙성 과정을 생략하거나 충분치 않다.
새우젓, 뭣이 중한디
새우젓은 보통 잡히는 시기에 따라 동백하젓, 오젓, 육젓, 추젓으로 구분한다.
계절 구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숙성의 시간이다.
사정상 수입이라도 시간의 맛이 쌓인 거라면 괜찮다.
맛이 좀 나는, 시간이 충분히 쌓인 새우젓을 내야 한다.
육젓이 최고라며 밥반찬으로는 좋아도, 김치 담글 때는 오젓이나 추젓이 낫다.
새우젓, 뭣이 중헌디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잡은 계절보다는 묵힌 시간이 더 중요하다.
6개월 묵힌 육젓보다는 1년 6개월 묵힌 추젓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농산물 전문가 김진영이 전해주는
생생한 식재료 이야기 뭣이 중헌디?!

👉방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를 잘못 알고 있었다?
👉봄 주꾸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다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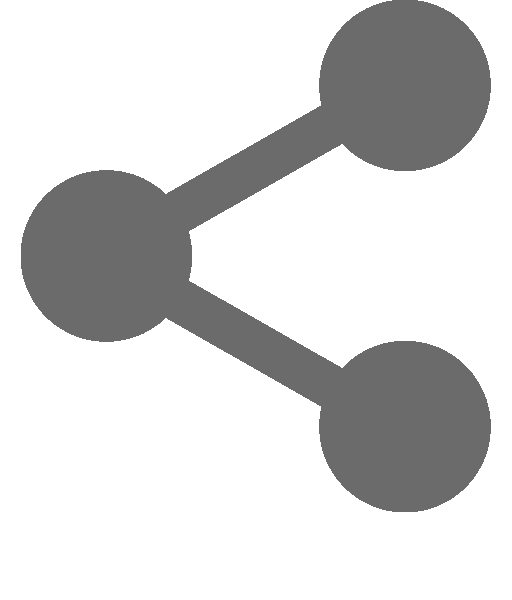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