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뭣이 중헌디?!
#11 주꾸미 🐙
두 번의 봄을 맞는다 🌸
탄생으로 한 번, 나머지 한 번은 죽음으로 만난다.
주꾸미 이야기다. 봄은 어미는 죽고 새끼가 태어나는 시기다.
주꾸미에게 두 번째 봄은 다음 세대를 위함이다.
봄에는 주꾸미가 제철이라고 한다. 잘못 아는 이들이 그리 이야기한다.
바로 잡자면, 주꾸미는 늦가을부터 초겨울이 제철이다.
봄이 오면
주꾸미 이야기를 많이 한다 💭
어시장에 가보면 주꾸미가 많이 보인다. 모든 미디어에서 주꾸미 이야기를 하니 대개 그렇게 알고 있다.
필자는 인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인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1970년대에 늦가을이면 주꾸미를 잡아먹었다. 봄에 주꾸미를 먹은 적이 없다.
가을, 망둥이가 명태만큼 커지면 선친 손에 이끌려 연안부두에서 망둥이 낚시 배를 타곤 했다.
주로 망둥이가 잡혔다. 간혹 손님 고기로 꽃게, 노래미, 주꾸미가 올라왔다.
갯지렁이를 끝까지 붙잡고 입으로 가져가던 꽃게 생각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난다.
주꾸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가을이 되면 서해에 주꾸미 잡는 낚시 배가 수없이 떠 있다. 새우 모양의 가짜 미끼인 에기로 주꾸미나 갑오징어를 낚는다.
망둥이와 주꾸미를 잡아 오면 엄마가 손질해서 말렸다. 11월 초, 마당 빨랫줄에는 며칠 동안 손질한 망둥이와 주꾸미가 걸려 있었다.
주꾸미는 하루 정도 말려서 냉동고에 넣었다. 살집이 있는 망둥이는 며칠 더 말렸다.
망둥이는 겨우내 아버지 소주 안줏감이었고, 말린 주꾸미는 우리 형제들 간식이 되었다.
오징어를 완벽하게 대체한 것이 바로 가을에 잡아 말린 주꾸미였다. 볶아 먹거나, 쭈삼(주꾸미와 삼겹살)은 생각지도 못하는 시절이었다.
주꾸미는
원래 아는 사람만 알던 식재료였다
다림질하듯 생활이 펴지면서 주꾸미는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부터 불같은 인기를 끌었다.
봄이면 TV 프로그램 여기저기서 주꾸미 이야기를 했다. 신문도 똑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했다.
그 사이 봄 주꾸미는 정설이 되었고 주꾸미 알은 별미 아님에도 별미로 만들었다.
90년대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 ‘주꾸미 대가리(사실은 몸통)에 든 알은 안남미와 비슷한 질감을 낸다.’
주꾸미 기사 중 가장 정직한 표현이다.주꾸미 알은 단백질 덩어리로 찰기라곤 없다.
그런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모양만 보고 찰밥처럼 생겼다고 떠들었다.
20년 가까이 봄이 올 때마다
어부는 주꾸미를 잡았다 🎣
봄 주꾸미를 즐기던 사람 중에서 가을이 되면 낚시꾼이 됐다. 그나마 살아남아 부화한 주꾸미 성어를 잡았다.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주꾸미는 명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획량이 떨어지자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것이 국내산을 대체한다.
명태를 복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건 사라지기 전 지키는 것보다 몇 곱절의 에너지가 든다.
봄 주꾸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다
알을 낳기 위해 봄이 오면 주꾸미는 먹지 않고 알 낳을 신방만 찾는다.
몸에 축적한 에너지를 산란에 모두 쓰고 죽는다. 그래서 봄 주꾸미는 맛이 없다.
봄에 주꾸미 잡을 때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 잡는다. 주꾸미의 산란 본성을 이용한 어법이다.
원래 찾지 않던 식재료였다.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미디어는 더는 봄 주꾸미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명태처럼 바다에서 사라진다.
북서풍의 찬 바람이 불 때 제대로 맛이 난다.
주꾸미, 뭣이 중헌디 알면 봄 주꾸미라고 해선 안 된다. 뭣 좀 알고 그 입을 열라.
농산물 전문가 김진영이 전해주는
생생한 식재료 이야기 뭣이 중헌디?!

👉새우젓 만들 때 온도보다 중요한 것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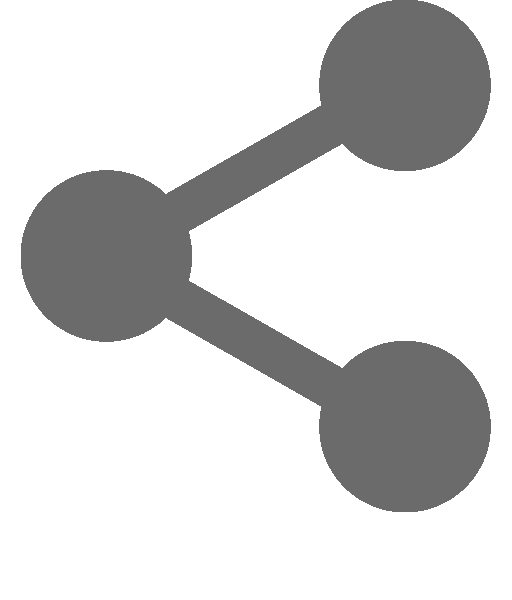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