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떼를 만들 때 '안정화'라는 작업이 있다.
에스프레소를 부은 잔에 스티밍한 우유를 부어 잘 섞이도록 하는 작업이다. 한 손으로 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팀 피쳐를 잡고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잘 섞이도록 위아래로 돌려가며 부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낙차와 속도조절이다. 에스프레소가 담긴 잔 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우유 줄기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어야 하는데, 조금 빠른듯하게, 그러나 생각보다 과감하게 부어야 한다. 너무 천천히 부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들이부어서도 안된다.
처음 우유를 붓는 초보자들은 이 안정화 작업을 많이들 두려워한다.
우선 생각보다 빠른 속도감에 놀라고, 우유가 쏟아질까 봐, 혹은 넘칠까 봐 제대로 과감하게 붓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심조심하기만 해서는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스프레소가 밑에 그냥 뭉친 채로 머물고, 더 나아가 라떼아트로 이어지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우유 거품으로 하트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안정화다. 하트를 만들 도화지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안정화이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보게 되는 건 하트 뿐이지만, 사실 하트를 만드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안정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화지가 지저분하면 하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2021년 겨울, 나의 상황은 많이 변했고, 그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해야 할 고민은 많았지만, 그에 비해 시간은 없었다. 깊이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래 고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더 알아봐야 하나. 더 알아보지 않고 결정해도 괜찮나.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어떡하지'의 문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따라다녔다.
큰 결정, 작은 결정을 구분 지을 수 없다. 모든 결정은 다 중대한 결정이었다. 돈을 더 쓴 결정은 있지만.
카페 일에 뛰어들어보니, 이건 커피와 디저트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박스와 포장과의 전쟁이었다. 뭐 하나 팔려고 해도 온갖 포장 용기가 필요했다.
컵은 어떤 사이즈의 컵으로 할 건지, 디자인은 기성 제품을 쓸 건지, 내가 직접 제작을 할 건지, 아이스컵은 또 따로 해야 하고, 컵홀더도 필요하고, 컵 뚜껑은 하얀색으로 할 건지 검은색으로 할 건지를 다 결정해서 빨리 주문해야 했다.
해놓고 보니 캐리어도 필요해서, 이건 또 비닐 캐리어로 할 건지 종이 캐리어로 할 건지를 정해야 했고, 빨대 종류는 또 뭐가 이렇게 다양한지. 케익을 팔려고 하다 보니 케익 포장 비닐과 상자도 또 필요했다.
(사실 난 지난 2년간 가능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며 살았었는데, 최근 두 달 동안 지난 2년간 안 쓴 일회용품을 다 쓴 것 같다. 어쩔 수 없지 싶으면서도 뭔가 씁쓸한 이 기분...)
문제는 뭐 하나 주문하면 다 박스 단위로 온다는 것.
종이컵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좀 좋은 컵을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려다 보니 최소 주문 수량이 10,000개(!)였는데 그것도 3주나 걸려 받은 종이컵 박스는 무려 20박스였다. 우리 카페 뒤 창고에 다 넣고도 8박스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서 옆집 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거기 지하창고에 잠시 보관해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아이스컵 박스, 컵 뚜껑 박스, 빨대 박스, 캐리어 박스 등 박스 더미들 속에서 나는 내가 박스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메뉴 하나를 더 추가하는 일은 또 새로운 박스들과의 전쟁이었다.
샐러드를 하려고 하니 샐러드 용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니 또 박스, 소스 용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니 또 박스, 파니니를 하려고 하니 샐러드 용기 말고 다른 용기가 또 필요해서 구입하니 또 박스, 일회용 물티슈와 포크도 필요해서 구입하면 또 박스, 들고 갈 수 있도록 비닐백이 필요해서 구입하면 또 박스...
이 와중에 좀 더 좋은 데서, 좀 더 괜찮은 걸로 찾고자 한참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2~3개 중에 결정해서 구입하면 그 결과는 박스 더미들로 나에게 찾아왔다.
쌓인 박스들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렇게나 많은 결정들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결정들을 위해 나는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았고 심사숙고했지만, '그래, 이걸로 하자'는 결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아니야, 아무래도 이건 하지 말자'는 결정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나는 그렇게 꼭 선택해야 할 것과,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단호해야 했다.
이 결정들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나는 이것 말고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숱한 결정을 해냈다. 이 결정들 속에서 나는 라떼 안정화 작업을 떠올렸다. 신중하게, 그러나 너무 느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과감하게.
...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 안녕워녕의 다른 글 보러 가기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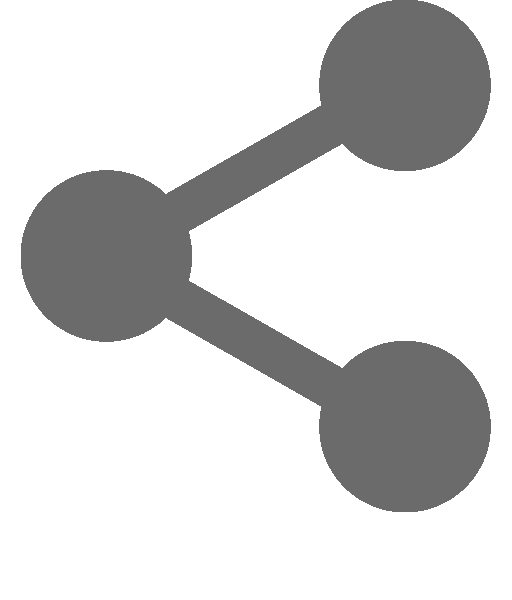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