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이 술술 풀리는 친구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겨우 스물세 살이었다. 또래의 대부분이 아직 학생일 때 그 친구는 사회인이 되었다. 3~4년이 지나 대부분이 취준생일 때 그 친구는 대기업 대리가 되었다. 다른 친구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친구는 외부 미팅과 해외출장을 준비했다.
삼포세대니 오포세대니 하는 세대에서 그 친구는 스물여덟 살에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이후 또 몇 년이 지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컸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도 했다. 친구는 워킹맘이지만, '워킹맘'이라는 수식어보다는 '능력 있는 과장'이 더 어울린다.
그 친구를 바라보며 많은 다른 친구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꼬이는 것만 같은데, 대체 쟤는 뭐가 다르기에. 저 인생은 왜 저리 술술 풀릴까. 쟤는 뭐가 저렇게 다 쉽게 되는 걸까.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만 생각했던 그 친구는, '참 절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기를 키우셨는데, 동생도 둘이나 있었다. 원래 집이 대구였는데 서울로 대학을 왔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대구에 있고, 혼자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고시원에서 먹고 잤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라고 할 수 없는 방에서 짐 더미를 깔고 덮고 잤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와중에 장학금을 받았다.
(친구는 이 장학금에 대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표현했다.)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한 번씩 대구에 내려갔고, 동생들 밥을 사주었다. 겨우 스무 살이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보낸 친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해야 했다.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주는 곳이 필요했다. 일찌감치 취업을 준비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스터디를 했고 토익을 공부했다.
그때쯤 나는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을 가야 할지가 고민이었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배부른 고민이었다. 당장 이번 달 고시원의 방세를 낼 필요가 없는 나의 배부른 고민. 나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가 고민이었지만, 그 또한 배부른 고민이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 친구는 "몸만 안 다치면 돼. 몸 다치면 다음 알바를 못하니까."이라는 명언을 남겼으니까.
그 친구는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난 이후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회사 가까운 곳의 원룸에 들어갔다. 대기업 시스템에 적응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았다. 더럽고 치사한 일이 많았다고 했다. 겨우 이런 일 하려고 그 힘든 공부를 했나 하는 일들만 시킨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 강도. 회사에서 허덕이다가, 원룸에 돌아오면 쓰러졌다고 했다. 잠을 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냥 쓰러져있다가 부스스 일어나면 그게 아침이라고 했다.
친구는 '방'이 아니라 '집'에 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자기가 아무리 일을 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다. 혼자 벌게 아니라, 둘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닥치는 대로 소개팅을 했다. 그렇게 만난 한 성실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고, 둘이 처음 간 곳은 은행의 대출 창구라고 했다. 내 집 마련의 설렘 같은 건 없었다. 대출 서류를 준비하면서 비참함만 더 크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왕 결혼을 했으니 빨리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낳아야 하루라도 빨리 클 테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부터 낳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다. 아기가 울면 자기도 같이 울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복직을 서둘러야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고 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아쉬운 소리를 했다고 했다. 대구에 계시는 엄마한테 부탁할까도 생각했지만, 엄마는 자기보다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 차마 못했다고 했다.
친구의 인생은 하나도 술술 풀리지 않았다.
큰 산 넘고 큰 산 넘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산을 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큰 산 앞에서 '저걸 넘을까 말까', '지금 넘을까 조금 있다가 넘을까' 해서는 큰 산을 넘을 수가 없다고. '저걸 반드시 넘어야 해!'하고 달려들어야 간신히, 겨우 넘을 수 있다고. (아니, 못 넘을 수도 있고.) 친구는 말할 때 '반드시'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스무 살 때부터 그 친구에게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당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다. '당장 월세를 내려면', '당장 이번 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내려면', '당장 내일도 살아가려면'.
'반드시'는 절실함이었다.
절실함 앞에 자존심은 없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할 시간 따위 없었다. 당장, 그냥, 뭐라도 해야 했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야 했다. 나가서 뭐라도 해야 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넷플릭스나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온 세상이 을 보며 현빈을 사랑하던 그때, 그 친구는 왜 카푸치노가 난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딨어." 그 친구는 이렇게나 절실하게 인생을 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사람은 '술술 풀리는 인생'이라며 부러워했지만, 술술 풀린 것이 아니었다. 친구는 늘 덤벼들었고, 뛰어들었다.
그렇다고 늘 쟁취해낸 것도 아니었다. 실패와 아픔도 숱하게 있었다. 고작 아르바이트 면접에서도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연락 준다고 해놓고 안 준다고 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토익 점수는 부족했고, 자기를 떨어뜨린 회사가 몇인지 셀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일어나 또 덤벼들었고 또 뛰어들었다. 절실함이었다. 친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덤벼들고 뛰어들고 있다. 절실함이다.
.
.
.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 안녕워녕 작가의 다른 글 보러 가기
🔗 자영업자 옆에 자영업자
🔗 '사장님'이라는 외로움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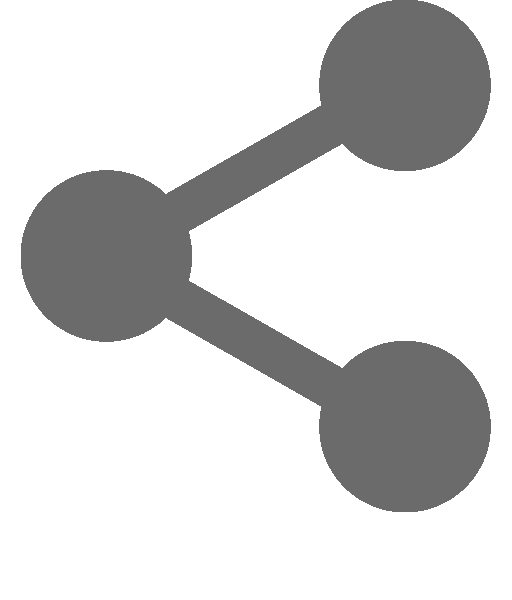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