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배부른 고민이나 하며 편하게 인생을 살아온 편이다.
그런 내가 카페 사장이 되면서 열정을 끌어 올렸고 의욕을 불태웠다. 다들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최고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국에, 나는 '미쳤네'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일을 벌여 사업을 시작했다. "뭐라도 해야 해!"하고 움직였다. 자매품으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가만있으면 안 되지!", "자, 어서 움직이자!"가 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더 만들어가며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며 몸을 움직였다. 그랬던 내가 의욕이 떨어진 7월을 보냈다.
이건 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 코로나 때문이다.) 매출이 꽤 줄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도 모자랄 7월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인지, 나의 의욕이 떨어진 때문인지, 아무튼.
그리고, 가게 오픈 때부터 함께한 우리 저녁 알바생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7개월 간의 알바를 마무리지었다.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생각을 하며, 손 놓고 있던 계산기를 두드려보았다.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저녁에 2명까지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2명이라도 오는 손님이 드문 현 상황에서) 새 알바생을 구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왕 계산기를 손에 잡았으니 다른 계산도 함께 해보았다. 그러고 보니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또 월세를 내야 하고, 관리비랑 재료비랑 알바비랑...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아니었구나. 줄어든 매출을 메꿔야겠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절실함이다. 의욕이 끓어올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절실해져서, 나는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뭐라도 팔아야 한다. 커피 위주로 장사를 하느라, 그동안 등한시했던 과일주스 생각이 번뜩 났다. 안 그래도 하루에 몇 번씩 과일주스를 찾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요즘이었다. 그럴 수밖에. 연일 37도, 38도의 뜨거운 한여름인데. 나는 과일 손질과 관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일주스를 팔지 않는 콧대 높은 카페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 최소한 계절과일주스 하나는 팔자. 그래, 뭐라도 하나는 팔자.
당장 수박을 주문했다.
수박 한 통에 얼만지도 몰랐던 나는 수박을 자르고 씨를 파냈다. 사실 이게 하기 싫어서 수박주스를 하지 않았던 건데, 수박 국물을 주방에 줄줄 흘려가며(특히 이게 싫어서 집에서도 수박을 잘 먹지 않는데!) 나는 수박을 손질했다. 설탕도 넣어보고 시럽도 넣어보고 꿀도 넣어보며 당도를 조절했다.
뒷정리를 하던 알바생이 "그럼 이제 수박주스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내가 "지금"이라고 하자, 알바생의 눈이 동그래졌다. 메뉴판부터 바꾸고, 수박주스가 그려진 상큼한 새 포스터를 출력했다. 그래, 하나라도 팔자, 당장. 수박주스를 먹는 손님들은 속 편한 소리를 쉽게 한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걸. 진작 좀 하지 그랬어요."
"아유, 시원하고 맛있네. 역시 여름엔 과일주스지."
사람들은 내가 심심하고 한가해서 수박주스를 만들어 팔 생각을 했는 줄 알지만, 절대 아니다. 쉽게 여름 메뉴 하나가 뚝딱 나온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된 수박주스를 손님들이 좋아라 하시고 하나씩 팔려나가는 이 모습은, 마치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자적하며 카페나 하고 있는 한 젊은 금수저의 술술 풀리는 인생의 한 단면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내가 수박주스를 만들도록 움직이게 한 것은 절실함이었다.
절실함이란, 곧,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라도 팔아야 한다'였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절실함이다. 사람을 절실하게 하는 2021년의 여름이다.
나는 절실함으로 수박을 자르고 씨를 파낸다.
이미지 클릭 시, 이동합니다
📖 안녕워녕 작가의 다른 글 보러 가기
🔗 사업 아닌 사업
🔗 빵 사주는 어른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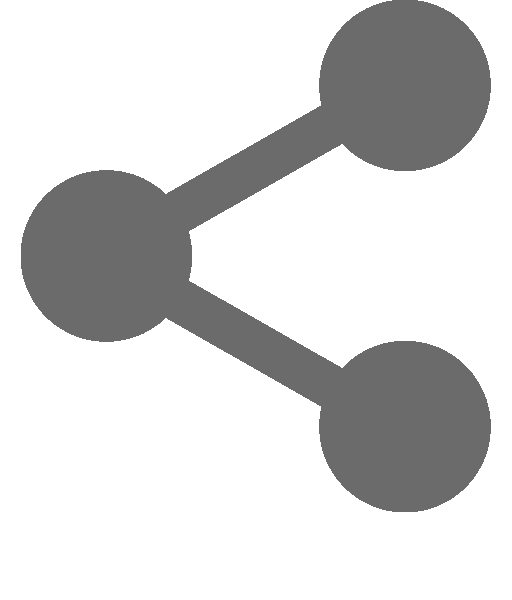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