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쓸모 있는 소금 이야기
3편 - 귀한 만큼 통제가 많았던 소금의 역사
염세를 둘러싼 끝없는 마찰
앞서 소금이야기 2편에서 '자염'에 대해 다루었다. 자염의 역사는 깊고, 얽힌 이야기도 많다.
조선 말기까지도 정부는 자염을 굽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었다. 이를 염세(鹽稅)라 한다.
염세를 둘러싸고 마찰은 끝없이 일어났다. 💥
다산 정약용은 염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걷자고 주장하였다. 땔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로 3등급으로 나누고, 가마솥이 쇠 가마솥인지 황토(흙) 가마솥인지에 대해 3등급,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시 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면 ‘상지상(上之上)’부터 ‘하지하(下之下)’까지 모두 9등급이 나왔다. 소금이 귀했으니 소금의 질도 다르고 세금도 달라야 했다.
자염을 생산하는 곳인 염소(鹽所)도 다양했다. 궁궐이나 국가가 주인인 경우도 있었고, 지방 관청이 주인이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사염(私鹽) 염소도 있었다. 주인들은 당연히 염소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다.
하지만 염부(鹽夫)에 대한 대우 문제와 염소를 빌린 대신 내는 도조(염소 임대 비용)에 관한 문제가 많았다. 모두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소금 전매제도
- 소금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
귀한 만큼 소금은 오랫동안 ‘전매(專賣) 제도’에 묶여 있었다. 전매 제도는, 소금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뜻으로, 세금 또는 염세를 걷기 위한 제도였다.
소금이 부족하니 정부는 사사로이 소금을 거래하는 일을 금했고, 대신 국가가 나서서 소금을 관리한 것이다. 전매청은 인삼, 담배 등 국가가 독점하던 생산품을 관리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는 천일염을 전매 제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했다. 소금을 국가가 관리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소금은 늘 부족한 필수품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때문이다. 💲
술에 대한 주세와 더불어 소금 생산과 매매로 거둬들이는 염세도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이었다. 해방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정부 세금의 주요한 품목이었다.
소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천일염은 상당 기간 전매 제도 아래 있었다. 국가 독점 품목이니 천일염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소비자들도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가 소금을 관리하니 국가를 믿고 천일염을 선택했다.
소금 전매 제도가 풀린 것은 1962년이다. 국가는 더 이상 소금을 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소금을 생산, 유통, 판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천일염의 위생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정부도 위생을 문제 삼아 늘 단속했다.
불행히도 대안이 없었다. 천일염 이외의 소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지 못한 때가 있다?
천일염의 운명은 기구하다. 1907년 한반도에 처음 소개되어 오랫동안 전매 제도 아래 있었다.
1962년 소금 전매 제도가 사라진 이듬해인 1963년, 천일염은 ‘염관리법’에 의해 광물(鑛物)질로 지정되었다. 광물은 철이나 석탄 등을 이른다. 법적으로는 소금이 식품이 아니라 광물이었고, 이는 일본이나 서구 등 외국의 사례를 따른 것이었다. 먹지 않을 광물질인 소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들은 없었다.
1992년에는 급기야 식품공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법이 개정되어 2008년, 천일염은 다시 식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천일염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는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 천일염의 연구는 이제 10년 남짓
일본은 20세기 초반부터 ‘정제염의 나라’였다.
우리가 식품 산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 천일염 연구 자료는 없다. ‘천일염 식용 금지의 나라’에서 천일염을 연구했을 리 없다.
천일염의 역사는 110년을 넘겼지만, 한반도 천일염의 연구는 이제 10년 남짓이다. 따라서 천일염에 대한 정보 축적량도 미미하다. 📖
‘지역 특산물’로 지정하여, “우리 소금 좋은 소금” “한반도 생산 천일염에 몸에 좋은 미네랄이 가장 많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자화자찬으로는 천일염을 설명할 수 없다.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홍보와 마케팅도 가능하다.

소금의 역사는 길다.
1) 중국의 '서경'에 기록된 소금 📔
| “만약 술과 단술을 만들자면 그대는 누룩과 엿기름이며, 만약 고깃국을 끓인다면 그대는 소금과 매실이라” |
‘소금과 매실’이 등장하는 위의 글은 “서경(書經)” ‘열명(說命) 하편(下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술을 빚으려면 누룩이 필요하고, 단술(甘酒, 감주)을 만들려면 엿기름이 필요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깃국을 끓인다면, 소금과 매실이 필요하다. 소금과 매실은 조미료의 시작이다.
곰탕은 대갱(大羹)이라 불렀다. 대갱은 국물의 시작이자 바탕이자 으뜸으로, 당시의 조미료였던 소금과 매실도 더하지 않은 고깃국물 그 자체다. 대갱에 조미료인 소금과 매실을 더하면 ‘화갱(和羹)’이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각종 탕(湯), 국물, 전골로 이어진다.
'서경'은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인 중국 고대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때 벌써 소금을 알고, 소금을 구해서 먹었다.
소금은 좋은 조미료이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약이나 다름없다. 💊
2) 일본의 소금 약탈 🔪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소금이지만, 소금 부족 현상이 사라지게 된 것은 기계염, 정제염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이든 국산이든 소금이 넉넉해진 것은 불과 50년 전부터다.
일본 역시 소금 부족 국가였고, 한반도에서 생산한 소금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빼앗겼다. 일본인들이 직접 염전을 운영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한국인들이 생산한 소금도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정제염의 나라'인 일본은 정제염 공장을 세웠으나 소금 공급이 부족하여 한반도의 천일염을 가져가 정제염과 천일염을 더불어 사용했다.
일제는 소금과 더불어 호남 일대의 쌀도 약탈하여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
중국, 2017년에 소금 전매제도 폐지
중국도 오랫동안 소금 부족 국가였다. 최소 2천 년 동안 ‘소금 전매 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소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했다. 일반 가게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했고, 소금 생산업자들도 소금을 팔지 못했다.
소금 생산업자나 유통업자 모두 국가 전매 제도 아래 통제를 받았다. 중국의 소금 전매 제도가 폐지된 것은 2017년이다. 전매 제도 아래서는 소금에 관한 연구가 필요 없었다.
천일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이유
오래된 전매 제도, 천일염 광물질 지정, 식용에서 제외 등 천일염의 기구한 역사로 천일염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천일염에 관한 과거의 연구 자료는 거의 없으며, 이제 겨우 자료 축적이 시작되었다.
자료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매일 소금을 먹고 있기 때문에천일염과 정제염 논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금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다.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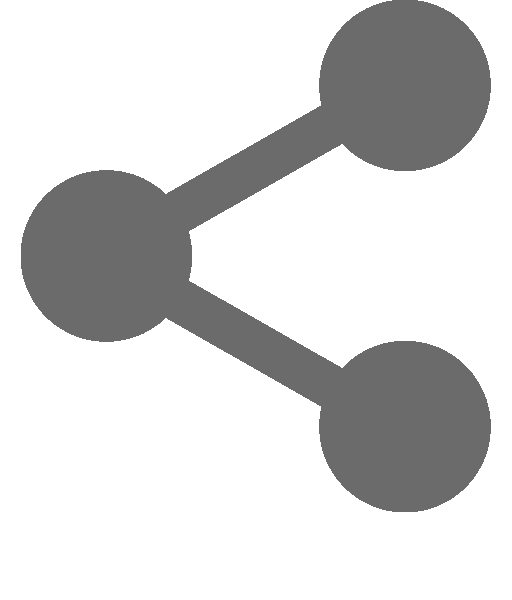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