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뭣이 중헌디?!
#45 진짜 맛있는 한우? 냄새부터 맡고 보자!
한우 이야기를 읽고 커진 소에 대한 호기심 🐮
몇 년 전, 모 셰프가 페이스북에 책 소개글 하나를 올린 적이 있다. <조선의 생태 환경사>라고 말그대로 조선의 생태 환경에 관해 쓴 책이었다. 조선 시대의 농지, 소나무, 말과 소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인데 호기심에 끌려 그 책을 사서는 심심할 때마다 읽었다.
내용 중에 한우 이야기가 있었다.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로 보낸 소가 1만 6천 마리였다. 어찌 그걸 보냈을까? 궁금했다. 🤔
흥미로운 것은 지금의 우람한 한우 모습과 달리 왜소했던 한우의 모습이다. 성종 때 오키나와에서 물소를 들여와 번식시키고, 한우와 교배시켜 몸을 키웠다고 했다. 키웠다고 해도 현재 한우 한 마리가 600kg 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때 당시 한우는 반 정도 되는 300kg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덩치는 작아도 다양성은 그때가 더 많았다. 조선 시대 한우의 종류는 9가지였다고 한다. 🐂

누렁이 말고 칡소와 흑우도 있다!
지금은 대부분 한우 하면 누렁이, 황소를 떠올릴 것이다. 그외에 칡소와 흑우도 있지만 이 사실도 일부만 알고 있다.
칡소를 처음 본 것은 2004년, 전북 완주에서다. 몇 년 뒤 완주의 칡소 대부분을 울릉군에서 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칡소가 울릉군의 특산물이 되었다.
제주에는 원래 흑돼지뿐만 아니라 흑우도 있는데, 현재는 많이 사라진 상태라 흑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넓은 초지에서 소를 사육하고 우수한 형질을 발굴해 내면서 사라진 흑우를 되찾고 있다. 🐃

거세한 소의 맛은 거기서 거기다.
2019년도에는 완주에 있는 한우 생산자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서 소들을 보니 황소가 가장 많고, 칡소와 흑우는 한두 마리 수준이었다. 궁금함이 밀려와 누구나 하는 뻔한 질문을 했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맛있나요?
돌아온 답은 우문현답.
👨🏻“누가 사주는 고기요.”
맞는 말이다. 누가 사주는 소고기가 가장 맛있다.
그리고 대답은 이어졌다.
👨🏻“딱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거세하지 않는다면 칡소가 조금 더 구수하다.거세우라면 구별하기 힘들다. 흑우든 칡소든 누렁소든 다 거기서 거기다.”
2018년 제주에서 맛본 거세 흑우의 맛이 딱 떠올랐다. 흑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먹음에도 차별점이 되는 포인트를 전혀 찾지 못했다. 😧
천천히 생각해보니 깨달은 것은 바로 ‘향’이었다. 한우 특유의 향이 거세우에서는 맡을 수가 없었다.
2020년, 대관령 인근의 목장에서 사육하는 칡소를 맛본 적이 있다. 붉은색 살코기만 있던 등심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다. 😋 여물을 끓여서 먹인 칡소도 맛보았는데 향과 함께 맛이 좋았다.
이 대관령에서 먹은 칡소는 거세하지 않은 수소였다. 씹을수록 세포에 품고 있던 향을 내줬다. 오래전부터 DNA가 기억하고 있던 소고기 향에 대한 기억이 났다. 💭

한우의 참맛은 향에서부터. 👃
우리가 음식을 맛있다고 느낄 때, 혀와 코에서 맛있는 냄새와 맛을 느껴야 한다. 코를 막고 먹으면 사과와 양파를 구별 못 한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거세우에서 심심함을 느낀 이유는 명확하다. 향이 약하기 때문이다. 수소이거나 암소이면 소고기 특유의 향이 난다.
한우는 가죽의 색이 중요하지 않다.
한우, 뭣이 중헌디 알면 가죽색으로 맛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향이 나야 음식이 산다. 한우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혹은 식재료를 고를 때 향이 먼저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산물 전문가 김진영이 전해주는
생생한 식재료 이야기 뭣이 중헌디?!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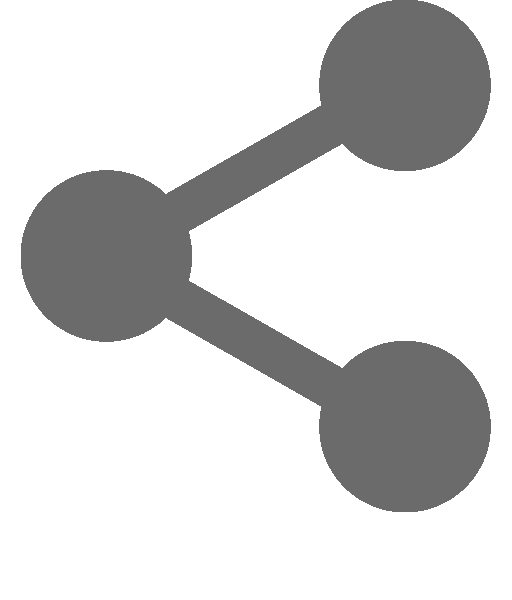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