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뭣이 중헌디?!
#29 어탕삼계 🍜🐔
오일장 🎪

한 달에 두 번 오일장 취재를 떠난다. 벌써 4년째다. 지난주 고령 오일장이 84번째 시장이다. 계절에 따라 가장 맛이 빛나는 곳을 찾아다닌다. 오일장 날짜를 검색하면서 무엇을 먹을지도 같이 검색한다.
TV에 나와 유명한 곳은 빼고, 지역과 계절이 맞는 메뉴를 주로 선택한다. 아니면 로컬푸드 등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을 먹기도 한다. 고령에서 먹은 것은 추어탕, 콩국수와 닭전, 장날에만 파는 돼지국밥과 어탕삼계가 있었다.
고령에서 첫 끼
네 시간 반을 운전해 먹은 첫 끼가 콩국수와 닭전이었다. 콩국수는 별로였지만, 닭전은 묘한 맛이 있었다. 다진 닭살과 채소와 청양고추를 다져 반죽한 것을 넓적하게 부친 음식이다.
고소한 맛이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보다 한 수 위였다.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포인트를 주는 사이사이 다진 닭살이 기름을 만나 내는 향과 맛이 전에 맛보지 못한 맛이었다. 콩국수가 아닌 칼국수를 선택했다면, 더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먹는 사이 메뉴 선택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다. 경상도식 추어탕도 좋았다. 시장 중간에서 파는 찹쌀떡 또한 괜찮았다.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메뉴가 바로 ‘어탕삼계’다. 😮😮
어탕삼계
어탕과 삼계의 조합. 어탕이 든 뚝배기 안에 삼계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원래는 몇 년 전에 딸기 보러 온 출장길에 맛본 어탕수제비를 먹을 생각이었다. 고령으로 출장지를 정하자마자 바로 정한 메뉴였다.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어탕삼계라는 메뉴를 보고는 바로 결정했다. 주문한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탕삼계가 나왔다. 사진을 찍고 맛을 봤다. 찍는 사이 먹기 좋은 온도로 내려가 있었다.
사실은 뚝배기에 내는 음식은 너무 뜨겁다.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뜨거운 음식은 혀가 마비된다. 시장기에 식당 찾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뚝배기에 내더라도 온도는 적당해야 한다.팔팔 끓인다고 정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적당한 온도의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어탕삼계의 특별함

어릴 적 엄마의 매운탕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낚시 가서 잡아 온 붕어로 끓인 매운탕과 비슷했다. 푹 끓인 붕어를 체에서 살을 뭉갰다. 체 사이 구멍으로 부서진 살은 빠져나오고 잔가시와 비늘, 대가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붕어 끓였던 육수에 양념하고는 살과 한 가지를 더 넣어 끓였다. 엄마는 따로 소고기를 넣었다. 물고기 육수에 고기 육수를 더했다. 게다가 집마다 있는 소고기 조미료를 넣으니 맛없으면 간첩이었다.
어탕삼계에서 그 맛이 났다. 소와 닭이 내는 국물이 조금은 다르지만, 물고기와 육고기가 내는 콜라보의 맛은 비슷했다.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먹는 사이 까먹고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
퍽퍽한 가슴살을 제피와 다진 마늘, 땡초 넣은 국물에 적시는 순간 다른 식감이 된다. 무미의 닭가슴살에 생기가 돌았다. 맛없는 닭가슴살이 그 정도였으니, 날개나 닭다리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읍내에서 26km나 떨어져 있기에 왕복 거리가 50km가 넘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궁금함이 귀찮음을 이겨서 갔었다. 만일 귀찮음이 이겼다면 맛난 음식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탕삼계의 희소성
다른 곳에서도 어탕 음식을 많이 먹었다. 남원, 무주, 금산, 영동, 옥천, 함양, 산청 등등 하천이 많은 지역은 어탕에 국수, 밥을 말아 파는 곳이 많다. 어탕삼계가 다른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웃한 식당에는 안 파는 것을 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국, 밥, 수제비 보통 이런 걸 넣어서 어탕을 낸다. 어떤 계기로 삼계를 넣었는지는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먹어 본 어탕과 삼계탕 중에서 가장 맛나다는 것이다.
새로운 메뉴 개발에 돈을 쓴다. 메뉴 개발 뭣이 중헌디 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부터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메뉴는 없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접목할 때 변화 있는 메뉴가 나올 뿐이다.
농산물 전문가 김진영이 전해주는
생생한 식재료 이야기 뭣이 중헌디?!
👉 돼지 등심의 다른 이름, 돈마호크 가격 과연 적정한가?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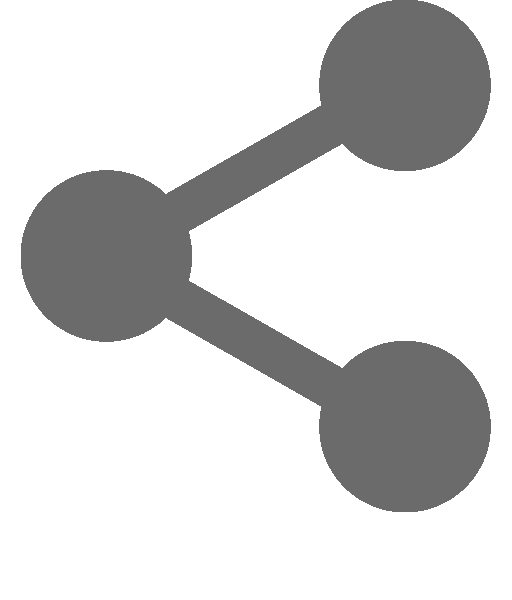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