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고기가 궁금하다 | 1편
맥적, 너비아니, 설하멱 그리고 불고기
불고기에 대해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한다. 불고기는 주로, 소고기를 익힌 음식을 말한다. 돼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돼지 불고기’라고 표현한다.
불고기는 소고기가 원칙이다. 이건 진짜 뉴스다.
우리는 언제부터 소고기를 즐겨 먹었을까?
혹은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한반도,
한민족의 소고기는 무엇일까?
‘맥적貊炙’이 ‘너비아니’로 그리고 너비아니가 오늘날 불고기로 진화했다고 말한다.
설하멱雪下覓이 불고기와 관련 있다는 이도 있다.
사실일까?
🔎 '맥적'이란?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에 재운 뒤 구워 만든 전통 요리로, 고구려에서 유래된 음식 🔎 '너비아니'란?소고기의 연하고 맛있는 부위인 등심 또는 안심을 도톰하게 저며서 잔칼집을 내어 간장 양념에 재워 두었다가 직화로 구운 음식 🔎 '설하멱'이란?쇠고기 등심을 넓고 길게 저며 썰어서 꼬치에 꿴 후에 기름장에 양념을 발라 구운 것 |
맥적이 불고기의 시작이다?
‘맥적 불고기’ 설은 육당 최남선이 처음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육당의 ‘맥적 불고기’ 근거는 중국의 <수신기(搜神記)>다.
육당 최남선은, (수신기의 내용에 따르면) ‘부여, 고구려는 맥족貊族이니, 맥적貊炙은 부여, 고구려 사람 즉 한반도의 선조들이 고기 먹던 습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
<수신기>는 지금도 책과 내용이 전한다. 서기 4세기경 동진 사람 간보(干寶, 생년 미상~351년)가 편찬했다. 작자 간보가 서기 351년에 죽었으니 대략 4세기 초반에 썼으리라 짐작한다. <수신기>는 ‘기괴한 이야기를 적은 소설’ 쯤 된다. 이야기 속에 당시의 풍습 등도 자연히 드러난다. 육당이 참고한 <수신기>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오랑캐의 상胡床과 맥족의 밥상貊盤은 적인의 기물翟之器이다. 강자羌煮와 맥적貊炙은 적인들의 음식이다翟之食也. (중략) 이는 융적이 중국을 침입할 징조戎翟侵中國之前兆였다. |
‘호胡’ ‘맥貊’ ‘적翟’ ‘강羌’ ‘융戎’은 중국 북방의 오랑캐를 아우르는 표현이다. 글에서는, ‘호’와 ‘맥’을 싸잡아 ‘적’이라고 기록했다. ‘맥’은 북쪽 오랑캐 중 하나다. 맥족도 여러 종류다. 우리 선조라고 이르는 부여, 고구려 부족은 예맥濊貊이다.
중국 북방의 맥족, 북방 오랑캐 부족 중에는 예맥이 아닌 오랑캐도 많았다. 맥족이 모두 우리의 선조는 아니다.
‘강자羌煮’, ‘맥적貊炙’은 ‘강족의 끓인 음식’과 ‘맥족의 구운 고기’라는 뜻이다. 당시 중국은 북방을 포함하지 않았다. 북방은 만리장성 너머 이민족, 북방 오랑캐의 땅이었다.
중, 남부의 농경 지역에서는 고기 대신 곡물이 주식이다. 고기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오리, 돼지, 개 정도를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북방의, 저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은 고기를 먹는다. 맛있고 신기하다.
북방 오랑캐의 여러 기물은 호화롭고, 끓인 고기(탕), 구운 고기 요리는 맛있다. 중국 사람들도 쉬 따른다. 부유한 자들이 앞다퉈 북방 오랑캐의 기물들을 갖추고, 잔치에 북방의 기물과 음식을 낸다. 오랑캐의 인테리어, 음식을 따르면 곧 오랑캐가 침범한다고 경계한다. <수신기>와 비슷한 시기 출간된 <석명>에는 맥적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내용이 드러난다.
맥적은 어떤 음식이었을까?
맥적은 '통구이'다.
(구운 후) 각자 칼로 잘라서 먹는데, 호맥胡貊의 방식에서 나왔다.
맥적은 '바비큐'다.
불에 구웠으니 불고기일 뿐, 맥적은 어느 모로 봐도 오늘날의 불고기와는 다른 음식이다. 불고기의 핵심은 양념이다. 중국인들은 맥적을 오랑캐의 비문명적인 음식으로 여겼다.
‘호맥胡麥’은 ‘호+맥’이다. 둘 다 북방의 오랑캐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오랑캐, 오랑캐 음식이라고 폄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업신여기는 음식을 우리 불고기의 출발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정확히 우리 선조들의 음식이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다.
아주 우스운 의문점 한 가지.
‘맥적’은 ‘맥족, 북방 오랑캐의 구운 고기’라는 뜻이다. 단어 어디에도 ‘소고기’란 표현은 없다.
무슨 근거로 소고기 불고기라고 주장할 것인가? 오히려 유목 기마민족인 북방 민족은 멧돼지 등 야생의 동물들을 사냥하여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냥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제쳐두고, 사료를 먹여서 힘들여 길러야 하는, 그리고 일을 하는 소를 도축하여 먹었을까?
과연 무슨 근거로 ‘맥적이 소고기’라고 주장할 것인가?
너비아니와 설하멱 그리고 불고기?
너비아니도 마찬가지다.
너비아니는 소고기를 넓적하게 썰어서 구워 먹는 방식을 이른다. 도대체 불고기와 맥적 그리고 너비아니가 어떤 면이 닮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흔히 양념하는 거로 너비아니와 불고기가 닮았다고 주장한다. 너비아니가 등장하는 조선 후기에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탕 등 대부분 음식이 양념하는 식으로 바뀐다.
너비아니만 양념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가장 널리 먹었던 고기 음식은 열구자탕悅口子湯이다. 열구자탕도 여러 양념을 섞어서 끓인다. 너비아니만 양념을 더했던 것은 아니다.
고기 음식 중 하나인 설하멱도 마찬가지다.
‘설하’는 ‘눈 아래’이고 ‘멱’은 ‘찾는다’는 뜻이다. ‘눈 아래, 눈 오는 날 찾는 음식’이다. <규합총서>에 나오는 설하멱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쇠고기 등심살을 두텁고, 길고, 넓게 하여 두드리고 잔금을 준다. 꼬치에 꿰어 기름장에 주무른 다음 숯불을 싸게 한 후, 재를 얇게 덮어 굽는다. 고기가 자글자글 익으면 냉수에 넣고 또 굽는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한다. 네 번째에 기름장, 파, 생강 다진 것, 후추 등을 발라 구워서 내놓는다. |
설하멱의 핵심은 양념 없이 세 번 구운 다음, 매번 냉수에 담갔다가, 마지막에 양념해서 굽는다는 점이다. 실제 설하멱을 만들어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다.
설하멱의 장점은 이른바 ‘겉바속촉’이다. 불 조절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 세 번으로 나눠서 고기를 구우면 겉은 타지 않으면서 바삭하게 그리고 속은 촉촉하게 구이가 완성된다.
설명문 중 ‘꼬치에 꿰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석쇠가 귀했던 시절이다. 석쇠는 만들기 쉬운 물건이 아니었다. 철사를 가늘게 빼기에는 합금 기술이 부족했고, 쇠를 담금질하는 불 조절 또한 쉽지 않았다. 석쇠가 없는 시절의 불고기? 역시 뭔가 어색하다.
설하멱은 편리한 석쇠가 없고, 고기 굽는 불 조절이 쉽지 않았던 시절의 ‘소고기 꼬치구이’다.
불고기는 맥적과 관련이 없고, 너비아니, 설하멱과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한반도 소고기의 역사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한다. 한반도 소고기의 역사는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반에 있었던 ‘거란의 고려 침입’부터 살펴야 한다. 소고기 이야기는 다음 편에 연결된다.
황광해의불고기 이야기
불고기가 궁금하다
👉 한반도 고기 문화의 시작 거슬러 올라가기!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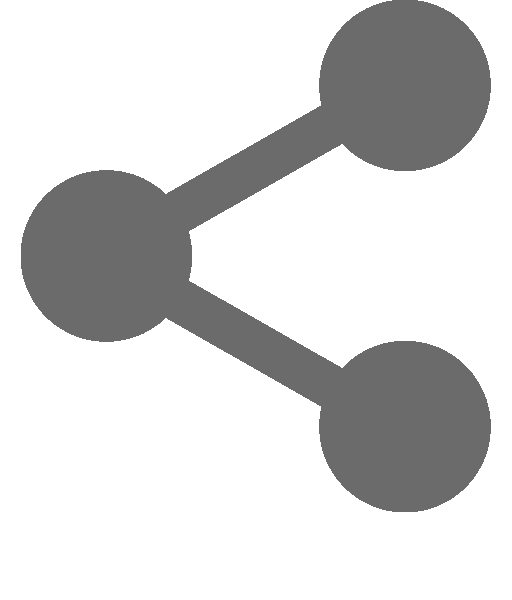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