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이 있으면 그냥 들어와서 주문만 하는 손님들이 나에게는 인사를 먼저 해주신다. "안녕하세요!" 내가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알바생에게 주문을 하던 손님이 나에게 꾸벅 인사를 하신다. "안녕하세요!" 나는 앞치마를 두르다 말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하고 인사를 한다. 그러면 손님은 말한다. "어디 가셨나 했어요." 나는 어디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가끔 가게 밖으로 나와 잠깐 동네를 한 바퀴 돌 때면 길에서 손님들을 마주친다. 내가 먼저 아는 척하기 전에 손님들이 "어디 가세요?"하고 묻는다. 심지어 처음 보는 분들도 날 보고 아는 척한다. "거기 그 카페 사장님이시네요! 어디 가세요?" 같은 자리에 있다 보니,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 나는 '거기 그 카페 사장님'이다.
농부들은 5월을 '깐깐오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일 많은 5월이라서 그렇단다. 봄이 무르익어 한 해 농사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할 게 많다. 그런데다 하루 해가 길어져 더 깐깐하고 지루하다고, 이런 의미에서 깐깐오월이라고 한다. 농부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5월은 깐깐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지난 1, 2, 3, 4, 5월이 깐깐했다. 아니, 나에게만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아마 많은 사장님들에게 지난 몇 달은 꽤 깐깐하지 않았을까. 할 일이 많아서 지치는데, 조금 하다 끝낼 수도 없게 하루가 끝나지도 않는 것이다. 대단한 수입은커녕, 월세, 관리비만 밀리지 않아도 다행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 요즘이다.
나는 이제 겨우 몇 달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지금을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나는 5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10명, 20명 이상의 단체손님을 이미 숱하게 받아보셨던 다른 연륜 있는 사장님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 번씩 옆 가게에 가서 사장님들을 만난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죠! 제가 좀 더 자주 놀러 와야 하는데요."라고 하면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신다. "거기 있는 거 다 아는데요 뭐. 장사 잘하고 있으면 됐지."
사장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
거기 잘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걸. 서로 얼굴 보고 끌어안고 격하게 반가워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걸. 그 자체로 인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걸. 우리 동네는 오늘도 모든 가게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바로 옆 추어탕 집도, 그 옆에 김밥집도, 모퉁이 미용실도, 건너편 갈빗집도, 갈빗집 옆 만두집과 중국집도, 그 옆에 떡집도 모두 문을 열고 손님을 만나고 있다. 각 사장님들은 서로의 가게에 굳이 들어가 인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진 않지만, 옆 가게의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린 걸 본다. 장사를 하고 있구나. 오늘도 문을 열었구나.
언제 어느 때에 옆 가게를 기웃기웃 해도 그곳에는 늘 그곳의 사장님이 계신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지도 않고, 따로 눈빛을 교환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창문 넘어 안에 있는 사장님이 일하는 모습을 본다. 오늘도 일을 하시는구나. 열심이시구나.

모두가 그 자리에서,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로다. 그 어떤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된다. 우리 카페도 그렇게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아침에 나와 가게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릴 뿐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다. 오늘도 문을 열었구나. 심지어 나의 커피를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손님이 계시니, 나는 또 열심히 장사를 한다. 어디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커피를 내리며 커피 냄새를 풍긴다. 오늘도 카페 문을 열었다.
+) 뉴욕의 그 베이글 가게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해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에게 그 베이글 가게는 그냥 '그 베이글 집'이다. '할머니가 아침마다 베이글 굽는 베이글 집'.
우리 카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카페의 이름이 브랜드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처음 봐서는 알바생인지 사장인지 모를 웬 젊은 사람이 커피를 볶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기 그 카페' 정도로 기억되는 것도 좋겠다.
그거 좋네. '거기 그 카페'.
📖 안녕워녕 작가의 다른 글 보러가기
🔗 나를 웃게 하는 귀여운 손님들
🔗 QR체크인이 뭐라고
🔗 사장님은 사장님이라서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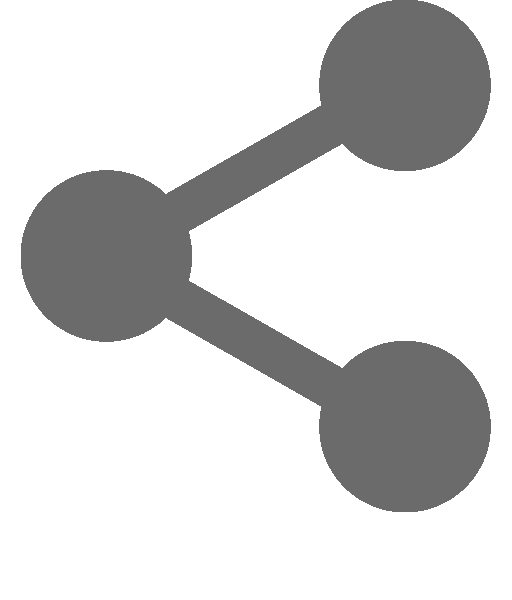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