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난 위로를 받은 적이 있다.
뉴욕에서 생활할 때였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했다. 오늘은 어제 같았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싶은 그런 날이 이어졌다. '직장을 다닌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날이면 날마다 실망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수평적인 뉴욕에서도 이런데,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얼마나 더 지루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기운차게 저벅저벅 걸어야 할 나의 아침 발걸음은, 그러나, 터덜터덜이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씻고 터덜터덜 출근했다.
출근길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아주 작고 아주 오래된 베이글 가게가 있었다. 할머니 사장님은 아침에 몇 시부터 나와서 반죽을 하고 빵을 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버스정류장에 서 있으면 빵 냄새가 솔솔 났다. 어느 날부터 나는 매일 그곳에 들러 베이글을 샀다. 버스정류장에서 서서 맡던 그 냄새가 내 손에 들려지면 솔솔 내 몸뚱이를 타고 올라왔다. 출근한 아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베이글을 먹었다. 단연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할머니 사장님은 베이글을 구웠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베이글 하나를 사서 손에 들고 버스에 타면 그게 그렇게 좋았다. 사무실에 올라가 앉아 종이봉투를 열어 베이글을 꺼내 한 입 베어 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기록을 찾아보니, 그날들에 대한 나의 기록은 이렇다.

매일(휴무일을 제외하고) 카페 문을 열었다.
가까스로 오픈 시간에 맞춰 문을 연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늦게 오픈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직장인 손님들을 만난다. "7월이네요!"라고 내가 말하자 나의 첫 손님이 "네, 그렇네요. 올해가 벌써 7개월이나 되었지만 매일 똑같아요. 하루 중에 이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주셨다.
불현듯 뉴욕의 그 베이글 가게가 생각났다. 터덜터덜 집을 나서다가 베이글 하나를 손에 들고 출근하던 그 길, 가방을 놓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고 베이글을 한입 베어 물던 그 아침이 떠올랐다.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
고작 베이글 하나였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 베이글. 그 손님께 내 커피가 그랬나 보다. "매일 똑같아요"라는 말에서 나는 그분의 재미없는 직장생활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루 중에 이 커피 한 잔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말에서 나는 베이글을 먹을 때의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에서는 줄줄 울었다.
생각해보면, 뉴욕에서의 그 베이글이 (물론 맛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소름 끼치게 맛있던 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베이글은 내 하루의 전부였다.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날은 무릎이 쑤시고, 어떤 날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일로 슬픔에 사무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사장님은 아침마다 베이글을 굽고 가게 문을 열었다.
내가 매일 아침 맡았던 베이글 냄새는,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모든 시간과 스토리가 집약된 냄새였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베이글을 굽는 할머니 사장님 덕분에 나는 하루를 살았다.
할머니 사장님이 건네준 베이글 봉지를 손에 들고 가게 문을 나설 때면 나는 늘 항상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Thank you!"라고 했다. 이 말을 할 때는 꼭 할머니의 눈을 보았다. 어떻게든 "제가 정말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답니다"하는 내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 가시는 나의 첫 손님은 내가 커피를 드리면 그 커피를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내 눈을 보며 또박또박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신다. 내 커피가 (물론 맛있긴 하지만) 그렇게 소름 끼치게 맛있어서 손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닐 것이다. 나는 매번, 이 눈 마주침이 황송하다. 뉴욕의 베이글 집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의 커피가 위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커피를 내리고 글을 쓴다.
내 글을 읽는 분들은 실제의 나를 모르고, 실제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글을 모른다. 부캐(또 다른 나)의 전성시대라는 요즘, '글 쓰는 나'는 나의 부캐인 셈이다.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고, 한편으론 '여기서 글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이 부캐가 원래의 '나'와 합쳐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체 카페가 어디인가요?" "꼭 가보고 싶어요"라고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니, 정말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카페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은 나를 보고 긴가민가 하신다. 아직은 나를 어리게 봐주셔서, 내가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나 보다. (아, 사실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오셔서 사장님을 찾을 때는 편리하기도 하다.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인 척 하며 "사장님 잠깐 나가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계속 갸우뚱하며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주문을 하시다가, "... 근데... 사장님... 이시죠?"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면 내 심장이 크게 쿵쿵거리기 시작한다. 아, 나를 알고 오신 분. 내가 몸을 배배 꼬며 "... 네...^^"라고 하면 "아, 작가님! 저 연락드렸던 사람이에요^^"하신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약속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다니. '여기 있는 사람'의 특혜다. 친구들도 그렇다. 이젠 내 스케줄을 묻지 않고 그냥 온다. 자기들 편한 시간에 그냥 온다. 약속을 하지 않아도 만난다. 아무튼 난 늘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난 '여기 있는 사람'이다.
📖 안녕워녕 작가 다른 글 보러가기
🔗 사업 아닌 사업(1)
🔗 또 오는 손님
🔗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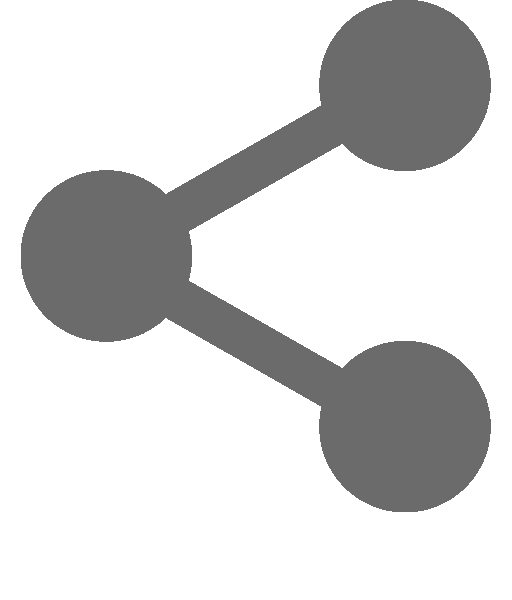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