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카페에서 판매할 딸기청이며 밀크티 시럽을 만들기 위해 종일 부산을 떨었다. 딸기를 송송 썰어서 설탕에 담가 딸기청을 만든다. 홍차잎을 장시간 우린 다음, 면천에 대고 홍차잎을 거르고, 뜨거울 때 어서 쥐어짜서 진한 액기스 홍차를 뽑아낸다. 그리고 나만의 시크릿 레시피로 숙성시키고 우려내 밀크티 시럽을 완성한다. 이것저것 음료 재료들을 만들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다. 딸기청을 담그고 밀크티 시럽을 만드는 동안 주구장창 설거지를 했는데도 설거지거리가 한아름이다. 큰 냄비며 이것저것 요리 도구를 씻고 열탕한다.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이토록 손이 많이 쓰인다.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자 내 '손'이 보인다.
손 중간중간에 냄비에 댄 옅은 화상 자국도 보인다. 손목은 하도 비틀어서 덜덜 떨리기까지 한다. 카페 사장 4년 차지만, 이틀 전에는 손님께 커피를 나르다 손목에 힘이 빠져 커피를 왕창 다 쏟아버렸다. 글씨체도 예전보다 삐둘삐둘 한 것 같기도 하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카페 사장'으로 불리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되려 상처투성이인 내 손이 자랑스러웠다. 파들파들 떨리는 내 손목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증거라고 여겼다.
하지만 눈을 질끈 감게 되는 손의 통증. 쓰라린 손의 감각에 고개를 젓게 된다. 이게 과연 적응하는 과정인 걸까? 되려 고통에 무뎌져가는 시간이 아닐까? 아니, 무뎌지긴 하는걸까?
처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리가 하고 싶어 졌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초보자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닭볶음탕을 저녁 메뉴로 결정했다. 그리고 네이버와 유튜브를 뒤져가며 최상의 레시피를 찾아냈다. 닭볶음탕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갔는데, 결혼할 때 엄마가 챙겨준 양념장들이 참 도움이 됐다. 멸치, 다시마 등등 육수를 내는 온갖 재료들과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 온갖 간장 종류들과 액젓들. 다져서 얼려놓은 마늘과 생강 등등. 엄마가 처음 재료들을 가져왔을 땐 '이걸 다 쓸 수는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요리의 세계는 신기한 게 저 모든 재료들을 적정 비율로 섞어내야 하나의 요리가 나오는 거더라. 레시피에서 단 하나의 재료라도 없으면 당장 요리를 멈출 수밖에 없던 초보 요리사. 그런 내게 만능이 되어준 건 엄마의 양념장 꾸러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땡초를 송송, 아니 와장창 썰어 넣은 매콤한 닭볶음탕이 땡겼다. 닭을 먹은 다음에 남은 양념장에 밥을 비벼먹으면 정말 꿀맛일 것 같았다. 냉장고에서 땡초봉투를 찾아 탈탈 털었다. 땡초는 한 10개 정도면 되겠지? 10개를 송송 썰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에 넣는다. 매콤함이 올라오는 냄새에 군침이 돈다. 나름 맵부심이 있는지라 냠냠 꿀꺽 맛있게 먹었다. 남편 빼고. 결혼하기 전 남편은 나와 함께 매운 음식을 먹으러 다녔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맵찔이(매운것을 못 먹는 사람) 었다! 데이트한다고 꾸역꾸역 매운 것을 먹어오다 오늘 땡초를 10개 넣은 닭볶음탕에 그만 이실직고를 해버린다. 땡초로 자백을 받아낸 순간이다. 휴. 앞으로 매운 음식 누구랑 나눠먹나.
그렇게 즐거운 식사시간을 끝내고 잠에 드려는데 갑자기 두 손이 아팠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손 마디마디가 저리고도 쓰렸다. 생무를 갈 때 쓰는 강판에 내 손을 밀어 넣은 마냥 쓰라렸다. 잠깐 피부에 무언가 조금만 닿아도 화상을 입은 듯 아렸다. 찬물에 담가도 보고, 로션을 발라도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잠이 주는 마취제로 그날 저녁을 겨우내 견뎌냈다. 통증은 일주일간 지속되다 겨우내 가라앉았다. 왜 이러지?
그리고 어느 날 야밤, 땡초라면이 급격하게 당기는 시간이 있다. 냉장고에서 땡초를 털어 넣어 라면을 끓였다.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려다 보니 또 손이 아린다. 나는 너무 놀라 엄마에게 SOS를 쳤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랐다가 엄마는 이내 푸후 웃어버린다. "왜 아픈지 알아?" 엄마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모르니까 전화했지. 왜 이러지? 요리하고 나니까 손이 쓰려" 엄마는 한차례 웃고 나서야 대답을 해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증거지. 너를 너무 곱게 키운 거지, 뭐. 땡초 만졌지? 땡초가 네 손에 매운맛을 주는구나. 요리를 하다 하다 보면 매운맛이 손에 적응돼서 점차 괜찮아질 거야."
아. 그때 처음 알았다. 아, 이건 손이 매운 거구나. 손이 매워서 쓰리고 아픈 거구나.
그 뒤로 '주부'로 산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는 시간이 조금씩 쌓일수록 내 손도 그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다. 뜨거운 건 덥석덥석 잡아내고, 땡초 10개 썰기는 이제 아무런 통증 없이 기본으로 하고, 큰 솥이며 냄비 등 무거운 것을 이고 나르는 것도 가뿐해졌다.

내가 엄마가 되는 동안, 나의 엄마가 엄마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게 된다. 엄마도 그랬겠지.
내가 30살을 먹어가는 동안, 엄마는 30년 동안 '엄마'의 자리를 위해 무뎌졌겠지. 손도 내놓고, 손목도 내놓고, 어깨도 내놓고, 허리도 내놓고, 다리도 내놓았다.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 '엄마'라는 이름이 만능키가 탄생했다. 뜨거운 것도 덥석 잡고, 일상의 자질구레한 물건도 휙휙 찾고, 무거운 솥이며 김장다라이며 확확 들고, 한 손으로는 아이 준비물에 학교 가방에 온갖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를 업어 드는 그런 강인함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놓은 손과 손목, 어깨와 허리, 다리 그 모든 게 이제서야 아프기 시작한다. 무뎌지는 게 아닌, 버텨왔던 지난날의 세월의 흔적들이 이제와서야 조금씩 상처를 내보인다.
나라는 인간, 엄마라는 역할, 카페 사장이라는 직업.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온전한 '나'의 하루를 살기 위해 오늘도 나는 엄마가 건너간 그 길을 걷는다.
📗 이전 글 보러가기│사장님 'H라테'주소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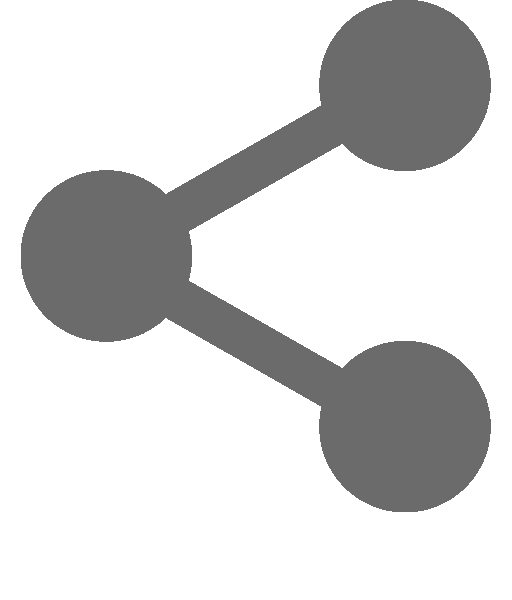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