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뭣이 중헌디?!
#14 시금치 🍃
남해 가면 떠오르는 음식

겨울이면 출장 가는 곳 대부분이 남쪽 해안가다. 간혹 태백산맥 너머 삼척이나 울진도 간다. 그렇지 않다면 전라남도나 경상남도가 대부분이다.
오일장 취재를 삼 년 넘게 하고 있다. 벌써 오일장 책도 두 권이나 나왔다. 경남 남해군에 가면 독일마을을 따라 한 미국마을이 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크기의 독수리상과 자유 여신상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지나가다가 슬쩍 쳐다보고 있으면 비웃음이 절로 나온다.
잠시 차를 멈춘다.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그 앞이 겨울이면 장관이다. 햇살 받아 빛나는 바닷가까지 층층이 밭이 펼쳐져 있다. 하늘도, 바다와 땅도 온통 파랗다. 시금치, 마늘, 양파가 번갈아 있다. 여름 다랭이논 못지않은 풍광이다.
좋은 풍경 앞에서 음식 하나가 떠오른다. 시금치 넣고 막 만들어 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 겨울이면 잡채는 꼭 한 번은 한다. 시금치 맛날 때 해야 하는 음식이다. 김밥도 그렇다.
시금치는 겨울이 맛나다
겨울이 되면 포항, 남해, 고흥, 완도 할 것 없이 남녘에서 나는 시금치를 가끔 산다. 원래 시금치를 싫어했다. 왜 먹는지를 몰랐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이나 운동회 때면 시금치 넣은 김밥을 쌌다. 엄마한테 시금치 빼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곤 했지만, 시금치는 그대로였고, 내 등만 매번 아팠다. 참으로 맛없었다.
영양적 균형? 색감? 싸서? 기다란 시금치를 왜 넣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때 시금치는 길었다. 지금도 그 시금치는 여름이면 만난다. 더운 여름에 잘 자라는 종으로 유럽이 원산지다. 더울 때 나오는 것치고, 단맛 나는 채소는 없다. 수분만 많을 뿐이다.
소풍이나 운동회는 더울 때 많이 했다. 그때의 시금치는 요새 한겨울 비금도에서 땅바닥 기듯 자란 것과 맛도, 모양도 달랐다.
겨울, 남쪽에서 자라는 것은 동양종으로 추위에 강하다. 추위에 강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채소를 고르라 할 때 예쁘고 모양 좋은 것을 고르라 한다. 무슨 기준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이 기준이 아닐까 싶다. 눈의 기준, 입의 기준이 아니고 말이다. 눈의 기준은 보기만 좋다.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좋은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농약이 없던 시절에는 벌레 먹은 것이 적었을 것이다.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리 고르라는 글이 지면이나 인터넷상에 차고 넘친다.

시금치 이야기를 꺼낸 김에 조금 더하자면, 국 끓이는 것은 잎이 넓고 긴 것을 고르라 한다. 무치는 것은 잎이 좁고 짧은 것이 좋다고 한다.
다들 그러라 하니 그런 줄 안다. 네이버에서 ‘시금치 고르는 요령’으로 많은 글이 검색된다. 대부분이 위의 내용과 조사만 다를 뿐 비슷하다.
글의 순서도 요령, 주의점, 먹으면 좋은 점, 레시피 순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공부 안 해서 전혀 잘못된 줄도 모르는, 전형적인 글이다.
하나는 검색만 할 줄 안다는 것이고, 둘은 검색 내용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잎이
길쭉하게, 넓게 자라지 못한다
얼어 죽기 십상이다. 만일 있다면, 하우스에서 혹은 공장 베드(수경재배)에서 재배한 것이다. 겨울 노지 시금치는 모양이 예쁘지 않다.
포항, 남해, 고흥, 신안에서 나는 것들이 다 그렇다. 어디가 중요하지는 않다. 짤막하거나 봄동처럼 납작 엎드려 자란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책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한 시금치일수록 색깔이 별로다. 거무튀튀한 색이 난다. 색이 검을수록 시금치의 단맛이 깊다.

눈이 보기에는 하우스에서 자란 것이 신선하고 좋아 보인다. 눈만 그렇다. 입과 혀의 기준으로는 시커먼 것이 맛있다.
채소, 뭣이 중헌디 알면 눈으로 고르라 하지 않는다. 아, 말 나온 김에. 시금치 이야기할 때 수산 이야기는 좀 빼라.
담석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것이 수산이다. 하루에 몇 kg을 꾸준히 먹어야 몸에 돌이 생길까 말까 한다. 그 이야기를 쏙 빼고 수산과 담석 이야기만 한다.
농산물 전문가 김진영이 전해주는
생생한 식재료 이야기 뭣이 중헌디?!

👉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숙성한다면?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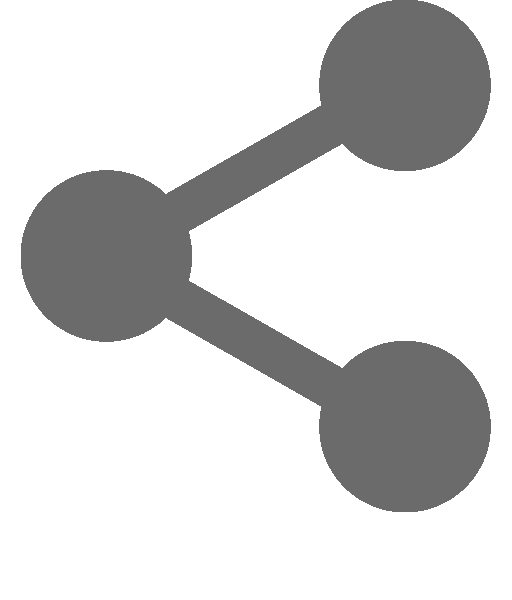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