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손님들마다 '사장님 도대체 몇 시에 주무세요?', '제발 쉬면서 하세요'라는 걱정 어린 위로를 건넨다.
그도 그럴게 손님들과 함께하는 독서모임, 그림책모임, 랜선 필사 모임 등등 온갖 활동들로 하루가 빡빡하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걱정을 듬뿍 묻혀 내게 말을 건넬 때마다, 나는 되려 씩씩하게 "제가 체력 하나는 끝내줘요"라고 말하곤 한다.
오늘은 아이가 카페&서점으로 하원했다. 이제는 익숙한 듯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엄마의 카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초콜릿을 찾아내고,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손짓으로 가리킨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나만의 사무실이자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는 아이를 보니 무척 행복하다. 일터에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이 감사하다.

한 시간 가량 카페&서점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 문을 닫았다.
오늘은 부리나케 문을 닫고 진주시청에 들렀다. 그동안 미뤄왔던 온갖 일들을 다 처리해본다. 아이를 끌고 1층 민원실에도 갔다가, 4층 회계과에도 갔다가 소상공인지원팀에도 갔다가 부산을 떤다. 자리를 이탈하려는 아이의 외투를 질질 잡아끈다. 다른 대로 새려는 아이를 잡기 위해, 외투에 달린 모자를 당긴다. '세무서에도 들려야 하는데.' 아이를 돌아본다.
느릿느릿 조그마한 걸음을 보다 답답해 둘러업는다. 겨우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차 문을 열고, 카시트에 앉힌다. 레이싱카를 몰듯 액셀을 밟는다. 오래된 차는 부르를 떨리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속도를 올린다.
겨우 시간 맞춰 도착한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위해 직원에게 이것저것 묻는다. 아이는 기다림에 지쳐 큰 소리를 낸다. 주변의 눈치에 서둘러 아이의 입을 막는다. 휴대폰에 유튜브를 틀어 아이에게 건네주지만 아이는 쉽사리 진정하지 않는다.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이내 의기소침해진다. 어르고 달래 동영상을 틀어준다. 흥겨운 뽀로로 노래에 아이는 이내 히히 거리며 집중한다.
어째 어째 세금신고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아이를 끌고 간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말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 엄마가 혼내도, 저를 내내 끌고 다녀도, 놀아주지도 않아도 나를 사랑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이. 하루 종일 내 뒷모습만 보고 있던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 달라 드는 듯 두 팔을 벌리며 '엄마'하고 부르는 아이.
'아아'
차에 등을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리고 두 다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만다. 죄책감과 슬픔, 무력감, 모든 교차하는 감정들이 나를 휘몰아친다. 아아.
나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감사히, 그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또 오롯이 보내고 있다.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카페&서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그리고 그것들을 제외한 오롯한 '나' 자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역할을 하루하루마다 수행하고 있다.
오전 7시에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아침을 먹인다. 9시에 등원을 시키고, 9시 30분에 카페&서점 문을 연다. 오전에 청소를 하고 나면 바지런히 영업을 한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투잡, 쓰리잡, 포잡을 찾아 일을 한다. 여유가 된다면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린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아이의 하원 시간이다.
눈물을 머금고 카페&서점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집에 와서 밀린 집 청소와 집안일을 끝낸다. 빨래를 돌리는 동안 아이에게 저녁을 먹인다. 아이를 씻기고 책을 두어 권 읽어준다.
그리고 오후 9시, 오지 않는 잠을 청한다.
아이가 고른 숨을 내뱉으면 일어나 밀린 집안일들을 한다. 카페에서 판매할 시럽이며 청도 바지런히 만든다. 그렇게 하다 하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면 터덜터덜 아이 옆에 오지 않는 잠을 청하러 간다. 하지만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의문투성이로 마무리한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카페&서점 사장으로 일하면서 내 생계는 유지하고 있는가? 오롯한 나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죄책감이다. 내 인생은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면 되지만, 내게 모든 걸 맡기는 저 순수한 아이. 나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의지하는 저 어린아이에게 나는 무얼 해주고 있는가?

엄마는 이런 나를 두고 말한다.
"아이를 낳는 순간 죄책감은 항상 엄마의 주요한 감정이 되어버리곤 하지. 네가 감기에 걸려도, 네가 책상 모소리에 부딪혀 아프다고 울어도, 떡을 먹다가 체해도, 입맛 없다고 밥을 잘 못 먹어도, 교우관계로 힘들어해도, 공부가 마음처럼 잘 안된다고 해도, 사회가 너무나 모질다고 해도 그 모든 게 엄마의 책임인 것 같고, 엄마의 잘못인 것 같고, 엄마가 못해준 것 같다고 여겨지지.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이상하게 늘 엄마의 곁에 따라오곤 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는 너의 엄마니까."
좋은 엄마란 무엇일까?
'좋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루 종일 곁에 있어주진 못해도, 동화책을 2권은 읽어줘도 10권을 못 읽어줘도, 매일같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진 못해도, 교육비로 많은걸 내어줄 수 없어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 아니한가.
되려 아이에게 엄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내고 있다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여길정도로 하루를 오롯이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 애매한인간의 다른 글 보러 가기
🔗 미라가 된 아빠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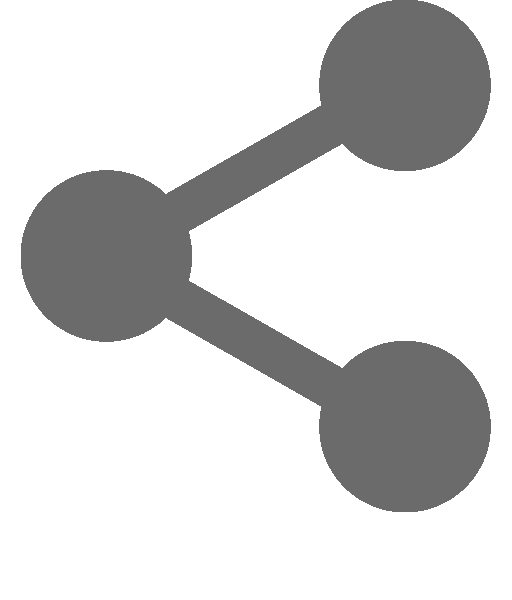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