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가족이 둘러앉아있는 식탁은 그날따라 고요했다.
엄마는 항상 '어른이 수저를 들고나면'이라는 말을 했던지라, 나는 아빠가 수저를 들길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어정쩌정한 모양으로 수저를 들었지만, 아빠의 수저는 테이블 위로 쨍! 하고 큰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엄마는 그때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나와 동생에게 "먼저 밥 먹고 있어"라고 말하며 아빠와 함께 방에 들어갔다. 굳게 잠긴 방 문틈에서는 싸늘한 긴장감이 새어 나왔다. 동생은 상황도 모른 채 밥을 입에 넣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참 밉게 느껴졌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엄마와 아빠는 내게 동생일 맡긴 채 밖으로 나갔고, 한참 뒤 돌아온 아빠의 두 번째 손가락에는 붕대가 감겨있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맥주 한잔 기울이며 하는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 군대는 철저하게 계급제다. 당시 상사인 아빠에게는 원사인 바로 위 상사가 있었다. 그는 평상시 주변의 험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아빠는 매번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왜 내편을 안 드냐'라고 하며 아빠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이다. 아빠는 손가락을 꺾인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는 치욕을 감내할 수 없었다. 견딜 수가 없는 모욕에 상사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문 앞에서 결국 노크 한번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곧 진급인데', '곧 월급이 오를 텐데' 이 생각, 하나가 아빠를 멈춰 서게 했다.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차마 '그까짓 거 그만둬!'라고 속 시원하게 말도 못 했다. 그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다독였다. 그저 '버티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라고 속삭였다.
그런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 어릴 적의 나는 분노했다. 부당함을 견디는 저 모습이 보기 싫었다. 아픈걸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부모님이 답답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속상했다. 나는 그 뒤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 관사에 사는 다른 이웃집 이모에게 반찬을 가져다주는 엄마를 보고 '내조하는 거야?'라고 했다가, 매몰찬 엄마의 시선을 받았다.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로 상사의 비위를 맞춰주는 아빠를 보고 '왜 그렇게 까지 하는 거야?'라고 했다가 아빠의 허탈한 웃음을 듣기도 했다. 이런 나를 보고 엄마는 '너도 너 같은 딸 하나 키워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다.
삶에 부조리함은 빠질 수 없는 양념 같은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미없는 상사의 아재 개그에도 웃고, 경청한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뭐만 하면 '넵'만 발사하는 '넵'병 직장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 퇴사를 했고, 인생은 퇴사할 수가 없어 지금의 서점&카페를 차리게 되었다. 서점&카페 4년이라고 사회의 매서운 맛을 모르는 건 아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나에 비해 아빠는 35여 년의 시간을 군대라는 조직에서 버텨왔고, 엄마 또한 아빠 옆에서 늘 함께해왔다. 삶은 이다지도 쉽지 않아서, 살아가는 게 가끔 정말 눈물 쏙 나게 힘들어서. 자꾸만 부모님의 삶이 떠오른다. 닮기 싫어했던 부분마저 닮아가고 있다. 한없이 작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사실 큰 풍파를 견뎌온 무척이나 큰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존경스럽다"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해본다. 우리도 현재 우리 아이의 '부모님'이 되었다. 우리도 우리네 삶을 열심히, 잘, 치열하게 살아냈을 때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 남아있는 밀크티, 그리고 카페라테를 단숨에 해치우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손님은 집으로, 나는 여기 서점&카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잘 살아내봅시다.
📗 밀크티와 카페라떼를 들고 건배! (1편) 보러가기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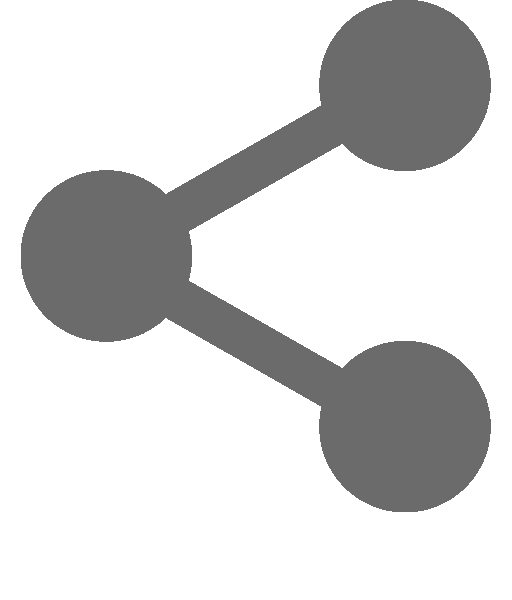 공유
공유










